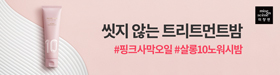제18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첫 인터뷰의 주인공은 ‘비정성시’ 심사를 맡은 윤가은 감독이다. 첫 장편영화 <우리들>로 각종 영화제는 물론 신인감독상까지 거머쥔 그녀였지만 미쟝센 단편영화제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며 수줍은 모습을 보였다. 영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감독은 인터뷰 내내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심사위원으로서 미쟝센 단편영화제에 처음 참여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제 영화를 상영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영화제에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 된다면 여기에서 상영이나 수상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번도 안돼서 나는 인연이 없나보다 했죠.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줄은 몰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은 작품 볼 생각하니까 좋아요.
평소 좋아하는 장르는? 비정성시 심사위원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비정성시 장르 정말 좋아해요. 거의 매년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찾아와 최대한 비정성시 장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왜 비정성시 심사위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 영화들이 사회드라마처럼 보이는건지. 그냥 제 영화와 뭔가 접점이 있는 것도 같고, 비정성시에 대한 제 팬심을 어떻게 알아보셨나 봐요. (웃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심사는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요. 심사할 땐 생각이 많아지고, 영화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이요. 개인적인 취향을 뛰어넘어 영화 자체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부분이 기대가 돼요. 여러가지 측면을 늘 고려해요. 어쩌면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보다 심사하는 게 더 많이 배우고 충만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럼, 더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더 좋은 평을 얻을까요?
개인적 취향을 넘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요. 감동과 재미는 기본이고 영화가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가치에 대해 탐구할 때, 그런 영화들이 더 마음에 남아요.
단편영화와 장편영화를 제작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둘은 완전히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단편영화를 만들 때 필요한 리듬과 호흡,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와 장편영화에서의 그것은 다른 작업인 것 같아요. 단편영화에서 장편영화를 만든다고 한단계 ‘업’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단편영화로서의 이야기적인, 작품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과 장편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 저도 다른 호흡으로 영화를 보게 되고, 다른 체험을 하게 돼요. 둘 다 어려운 건 같아요.
<손님>, <콩나물>, <우리들>은 전부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늘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파악이 안되는데, 아이들의 귀여움을 밀고 나가는 것 (웃음). 아이들에게 빚진 게 많죠.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겪어봤고 편안하고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스크린에서 볼 때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서 좋게 봐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관계’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가진 관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식하면서 한 건 아닌데, 관심이 있나 봐요. 요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모두에게 일어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중 저를 제일 기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잘 안되는 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화로 인해 인생이 변한 순간이 있다는 인터뷰를 접했어요. 어떤 순간이었나요?
시시때때로 자주 변해요. 영화적 체험이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올 텐데, 좋은 영화를 보면 극장을 나설 때 다른 세상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갈 때 봤던 똑같은 길이 달라 보이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어요.
초등학생 때 텔레비전에서 <박하향 소다수>라는 프랑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가 인생을 바꿨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예요. 성장영화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12살 어린 소녀가 한 철을 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땐 그냥 하길래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봤는데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기쁘고 아파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게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든가 혹은 더 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거나 쓰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아요. 두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건 영화 밖에 없어요.
이번에 ‘여성감독 특별전’이 있는데, ‘여성감독’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은?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 자신이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주로 평가받을 때 여성이라는 게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저로서 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성감독이 만든 여성영화, 그래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아이러니하죠. 남성감독이 만든 남성영화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성이라는 단어를 떼어 버리고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게 모두가 원하는 삶이겠지만, 지금은 여성감독의 여성서사를 다룬 작품들을 특별히 조명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감독님이 있어 이런 작품들도 있어 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이상 이렇게 특별하게 조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된 미쟝센만의 매력이 있다면?
일단 재밌어요. 여러 장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제라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이경미 감독님의 <잘 돼가? 무엇이든>을 보고 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 상업영화 데뷔를 하셨어요.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봤던 감독님들이 장편데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감독님께 단편영화란?
진짜 어렵네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웃음)
어쨌든 좋은 영화는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경험을 준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좋은 단편영화는 가장 짧은 시간에 누군가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윤가은 감독의 매력이다. 윤가은 감독이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감독의 영화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