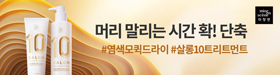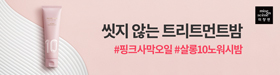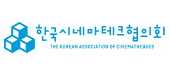어떤 소녀가 알지 못할 감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그 표정은 너무도 강렬해서, 영화가 끝난 뒤에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채운다. <링링>의 윤다영 감독을 만나보았다.
Q.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찾은 소감은?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관객으로 항상 영화는 보러 오지만 오면서도 내가 감독으로 올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나요. 다른 작품들 보니까 다들 잘 만드셔서 배워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Q.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중학생 때였어요. 강동원 배우의 팬이어서 이명세 감독의 <M>을 봤어요. 보고 나서 감독이 이런 거구나, 되게 멋있다,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영화를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Q. <링링> 작품 소개 부탁 드려요.
<링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진아의 성장이야기입니다. 진아는 미미한 성장이지만 조금씩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Q. 연출의도를 보니 가족의 해체에 불안함을 느끼는 진아와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 앞의 인간이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다기 보다 이미지로 시작했어요. 처음 떠올린 이미지는 아빠가 발기된 상태로 시체로 돌아왔을 때의 장면, 뼛가루를 뿌리는 날이라는 설정에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진아에게 집중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진아는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것 만큼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바람 앞의 있는 사람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Q. 김주아 배우의 캐스팅 과정이 궁금합니다. 진아를 캐스팅할 때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 있었나요?
프로필을 받고 그 중에서 딱 한분씩만 연락을 드려서 만났던 배우들이 바로 캐스팅되었어요. 김주아 배우는 만나자 마자 너무 신나서 혼자 속으로 이거는 진아다 놓치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배우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못해요. 단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진아의 분위기나 느낌을 생각했어요. 충고로 들은 게 있다면, 지도교수님께서 아빠를 발견하고 태풍 속에서 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배우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만큼은 봤으면 좋겠다고. 배우를 만나는 과정에서 표정을 시켜보진 않았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포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Q. <링링> 속 소품들이 눈에 띄어요. 진아의 책상에 놓여있는 많은 바비인형들이나 화장실, 베란다에 많은 화초들, 방문과 소파 위 액자. 보통 화장실에 식물을 두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건지 궁금합니다.
화초와 액자 같은 경우는 엄마의 영향, 성격을 나타내요. 하다 못해 지나쳐서 넘쳐 흐르는 성격이요. 말도 애정도 거칠고 과한 인물이기에 그것이 집안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식물이나 액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진아의 방까지도 스며들고 다같이 쓰는 화장식까지도 잠식해버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바비인형의 경우는 집중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웃음) 저는 진아가 촌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옷도 막 핑크색, 노란색 같이 엄마가 주는 대로 입고. 그런 촌스러운 감각을 가졌을거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바비인형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투영된 것 같기도 해요.
Q. “낚싯대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수면에 꽂히는 감촉 알아?” 라는 대사가 인상 깊어요. 아버지가 저수지에서 하는 자위행위와 화초에 치약이 튀는 장면 등 성적인 묘사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면들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빠 캐릭터가 결국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태풍 장면만 보여준다고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전에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아빠나 진아가 느끼는 성적인 텐션을 표현한 거예요. 살짝 성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면들이에요.
Q. 검색해보니 <링링>이라는 제목이 소녀의 애칭을 의미하는 태풍의 실제 이름에서 따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이름을 찾았고 지을 수 있었나요?
마지막에 대사에도 나오듯이 예전에는 여자 이름으로 태풍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름을 고민하다가 직접 있는 태풍의 이름을 찾게 되었어요. 뭔가 링링이라는 게 중국의 느낌도 들고 아무 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듣기에 안마 업소같은 퇴폐적 업소를 떠올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링링이 소녀를 뜻하는 이름이어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Q. 결과적으로 링링이 가족의 해체를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진아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춘기의 성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진아라는 인물이 감독님을 투영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시나리오를 오래 썼는데 어느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진아가 너무 답답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저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진아는 저와는 다르길 바랐어요. 조금의 선택을 하고 조금의 행동을 하는 친구로 만들고 싶었고, 아빠를 찾아 떠나는 것이나 사실을 알고 있어도 엄마와 동생에게 말하지 않는 것도 진아의 선택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나는 성장했어 라고 하기 보다는 지나가버리는 순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나중에 진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미미한 성장들이.
Q. <링링>은 절대악몽, 공포 장르라고 하기엔 더 일상적인 주제와 비유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링링>이 어떤 장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처음에 배급사에서 미쟝센 단편영화제에 출품하는데 어떤 장르로 내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고민했을 때 전 절대 절대악몽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경악하시더라고요. (웃음) 비정성시가 아닐까 싶다가도 그렇게 문제의식이 뚜렷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장르든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절대악몽에 됐을 때는 감사했죠. 같이 껴서 절대악몽이 될 수 있어서. (웃음)
Q. 비 오는 날씨가 중요한 영화인데, 촬영하는데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찍은 게 아니고 다 만든 거예요. 비도 뿌리면서 카메라 앵글 밖에서는 강풍기로 바람을 만들었어요. 스탭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게 만든 태풍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커요. 나중에 영화를 보면서도 화면 밖의 스탭들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절히 태풍이 오길 바랐는데 그러진 못했고, 날씨도 흐리지 않아서 만들어낸 태풍에다가 후반작업으로 마무리 한 장면입니다.
Q. 엔딩에 나오는 진아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그 장면이 진아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거든요. 그 지점이 진아가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정표현이나 감정기복이 없는 아이인데 마지막이 되어서야 표현하는 부분에 틈이 생기는. 미미하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진아가 느끼는 감정에 여운을 주고 싶었어요.

Q. 영화 시나리오를 쓰실 때 보통 어디서 소재를 떠올리시는 편인가요?
전에는 생선이라는 이름으로 두 편의 단편을 찍었어요. 그 작품의 경우는 생선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나의 감정을 섞어서 표현했고, <양치> 같은 경우는 양치하는 모션이 성적인 행위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를 포착해서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게 많아요. 이미지에서 감정을 끌어와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편이에요. 분명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전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 장면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면서 작업을 이어 나가요.
Q. 감독님의 영화철학이 있다면?
저도 많이 변화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생각과 색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미쟝센 단편영화제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응원을요? (웃음) 제가 응원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응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부끄러움도 많고 아직은 영화얘기를 할 때 화들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에서 대담해질 때 응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Q. 감독님께 단편영화란?
그냥 영화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것을 표현할 때 짧은 이야기가 적절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은 긴 이야기를 하기에는 확장할 만한 이야기를 찾지 못해서 단편은 단편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저에겐 그냥 영화죠.
우리가 이렇게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격려도 칭찬도 아닌 아픔이었다. 사춘기 시절 사회와 가족 그리고 나로부터 오는 모든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윤다영 감독이 말한 것처럼, 우린 그렇게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