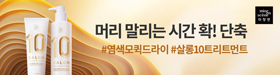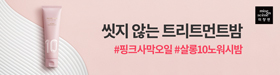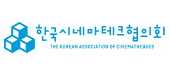영화관에서 쉽게 볼 법한 영화는 아니었다. 어딘가 어색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이상하리만큼 섹시했고 솔직했다. 미완의 매력이 마치 홍수가 터진 듯, 빠르게 흘러 들어와 머리 속에 가득 차버렸다. 영화 내내 이어지는 번뇌의 몸짓은 오고 가는 부산 사투리처럼 <미완성>만의 강한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가공되지 않은 예술 속의 예술을 스크린 위에 펼친 이 용자는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었다. 그는 영화 감독이자 안무가인 장대욱이다.

<장대욱 감독>
현대무용을 전공하셨죠? 같은 예술이지만 무용과 영화는 큰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영화를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 저만의 표현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원래 연기를 공부했었고 26살 때 무용을 시작했어요. 미친 척 하고 연습을 했죠. 무대에서는 표현의 제약이 많아요. 반면 영화에서는 좀 더 자유로우니까. 두 장르의 매력을 제 방식으로 맛있게 비벼보려고 했어요.
첫 시도 만족하나요?
– 첫 영화라. 많이 부족해요. 영화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미완성. 이번작품은 스토리가 조금 약했어요. 앞으로는 스토리를 탄탄하게, 그리고 무용이 더 돋보이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재미있게요.
배우의 춤을 독특한 카메라 움직임으로 담은 <미완성>의 시작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추격 장면도요. 춤과 추격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내적인 표현과 외적인 표현. 초반에 나오는 춤은 내적 표현이고. 무용수로서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표현했어요. 괴로움이 얽히고 설켜서 두려움도 존재하고요. 추격은 외적 표현이었어요.
‘악역이 가장 쉽다고. 그냥 드러내면 되거든’ 이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인간의 내면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나요? 성악설을 믿는 건지?
– 예술을 하면서 많이 겪는 괴롭고 힘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되니까 악역이 쉽다는 거였어요. 성악설까지는 아니고요.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데, 작업을 하다 보면 마냥 좋았던 초심에 현실적인 괴로움들이 더해져요. 오기로 하고 좌절 하고 다시 또 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럼에도 연기 하는 순간, 춤추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기 자신 찾고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예술은 미완성의 사람들이 미의 완성,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답지 않은 삶에서 미학을 찾는다’는 내레이션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픔을 앓아야만 아름다움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앓음을 이겨내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자기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 순수한 상태요. 그걸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이 어렵네요. 괴로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순간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삶에서 미학을 찾는 게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무용과 영화를 비교해주실 수 있어요?
– 기술을 알고 솔직하게 자기 색깔로 이야기 하는 건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점은… 영화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지만 무용은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돌이킬 수 없죠. 서로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댄스필름 만들 생각이에요.

다음 작품이 기대돼요. 마음에 그린 시놉시스가 있어요?
– 다음 작품은 빠르면 시월에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목은 <니체도 죽었다>인데, 제목만큼 철학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야기에요.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허무한 젊은이들이 펜션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요. 고민도 함께. 물론 춤과 연극적 대사도 들어가고요. 이번 영화에 나온 영민이(김영민 배우)는 저랑 평생계약 맺어서요. 출연할 예정이에요.
춤에 몰두하면 온전히 내면에 집중하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하셨어요. 그 짧고도 긴 시간이 인생에서 어떠한 힘으로 작용하나요?
– 마약 같은 힘이에요. 그 순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순수한 자신이 되었으니까. 근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아주 허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해내는 게 어렵고 다시 현실에서는 껍질을 싸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게… 그러면서 또 그 마약 같은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갉아먹는 게 예술가들이고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숙제가 아닐까. 현실의 삶도 자신의 삶이니까.
남기고 싶은 말.
– 영화의 마지막 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용은 비언어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니체는 이상적인 인간을 나체와 춤추는 자로 비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장면은 춤을 통해서 순수함과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표현했어요. 순수예술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미완성>에는 ‘이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줄 필요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반어적 표현이고 관심 가져주면 너무 감사하죠.
자기만의 색깔로 삶을 색칠하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완벽은 곧 가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스운 껍데기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미완의 상태를 주저없이 보여준 <미완성>처럼 말이다.